경주 남산 20201121 토
경주 남산 / 금오봉(458m), 고위봉(495m) 20201121 토 솔로(K&S)
코스 : 상서장(上書裝)-남산신성(사적제22호)-맨다리고개-남산신성(일부구간복원곡사중)-게눈바위-해목령/포석정갈림길-금오정(전망대,휴식)-상사바위-사자봉(429m)-정자터-남산 금오봉(468m)-연화대-대좌-삼층석탑-산정호수-백운대-남산 고위봉(495m)-백운대-신선대(마애보살반가상)-칠불암-염불사지/동서탑-남산동동서삼층석탑-서출지-통일전주차장-정강왕릉-헌강왕릉-화랑교육원입구 <19km/7:15>
07:05 집에서 출발
07:21 화명역 탑승
07:41 양산역 하차
08:05 양산시외터미널 경주행 버스 탑승
08:55 경주시외터미널 하차
08:58-09:09 경주터미널-상서장 택시
<경북15바6500/김문수/010-8591-3305
5.096km/6,700>
=========
09:10-20 상서장 주변 관람 후
09:21 산행 시작
09:25 최치원선생 전시관 안내도/ 미개관
09:27 [금오봉4.7]
09:48 전 삼화령(1925. 석조삼존불산 출토된 곳)
10:02 경주 남산신성 안내판(사적 제22호)
10:08 [금오봉3.2, 상서장1.5, 불곡석불좌상0.9, 불곡마애조상군0.5]
10:16 데크전망대/벽도산, 망산 조망
10:30 개눈바위봉(273)
10:47 정망바위봉(278)
10:52 성곽보수공사구간
10:53 경주남산신성 안내판(사적제22호)
10:55 해목령,포석정갈림 [금오봉2.2, 상서장2.5, 통일전주차장6.0, 탑곡마애불상군1.5, 불곡석불좌상1.9]
11:12 [금오봉1.4, 통일전주차장5.2, 포석정주차장3.3, 통일전1.0, 옥룡암2.6]
11:19 금오정/조망, 휴식
11:38 [금오봉1.2, 통일전주차장5.0, 금오정0.15, 포석정주차장2.7/3.5, 금오정0.15]
11:44 상사바위
12:00 정자터
12:06 헬기장
12:08 공원지킴터,데크]
12:15 금오산 정상(468m)
12:37 [금오봉-0.7, 포석정주차장5.0, 통일전3.5, 용장마을3.0, 용장사지0.55]
12:42 삼화령/고위봉 방향 조망판
12:44[연화대좌60m]
12:46 연화대좌
12:50 [용장계 연화대곡 비석대좌50m]
12:51 연화대곡 비석대좌 보고 백
13:30 [금오봉-1.5, 포석정5.8, 통일전2.7, 천룡사지3.4, 칠불암1.8, 고위봉2.5]
13:08 이영재 [금오봉-1.7, 고위봉2.3, 용장마을2.3]
13:25 [금오봉-2.05, 고위봉2.0, 칠불암1.35]
13:35 데크계단,난간
13:38 석문
13:44 [금오봉-2.85, 고위봉1.2, 칠불암0.55, 용장계지곡삼층석탑]
13:50 [용장계지곡삼층석탑0.08]
13:51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13:57 산정호수 [고위봉0.8, 칠불암1.15, 용장마을3.35, 용장계지곡삼층석탑0.27]
14:02 백운재[고위봉0.5, 용장마을3.16, 통일전4.35, 칠불암0.85]
14:15 고위봉 정상 (494m)
14:35 다시 백운재 [고위봉0.5, 용장마을3.16, 통일전4.35, 칠불암0.85]
14:41 [고위봉0.8, 용장마을3.45, 통일전4.05,금오봉3.25, 칠불암0.55, 새갓골주차장1.95]
14:48 [신선암60m]
14:51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14:55 내림계단
15:02 경주남산칠불암마애불상군 [고위봉1.35,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0.2, 용장마을4.0, 통일전주차장3.5]-이어지는 내려가는 돌계단
15:28 [고위봉2.7, 칠불암1.35, 용장마을5.35, 통일전2.15]
15:30 다리 건너, 차단기 등산인 체크,
15:32 경주 남산 승소곡 삼층석탑 안내판
15:36 마을 끝집, 고목
15:40 주차장 옆에 지게3개, 칠불암내려온짐, 올라가는 짐
15:43 남산동(전 염불사지) 동서삼층석탑
15:54 산수당(풍천임씨)
15:56 경주남산동 동서삼층석탑(해체복원중)
16:01 상사바위 안내판/위쪽 능선부에 보임
16:03 무량사(풍천임씨 고택을 절로 바꾸어 1972년부터 조계종 사찰로 사용중 대웅전 건물은 400년 이상 오낼 건물)
16:04 서출지
16:08 통일전
16:11 동남산 안내도
16:12 정강왕릉 들머리/이쪽엔 안내가 없음
16:16 정강왕릉
16:23 헌겅왕릉
16:25 도로변 헌강왕릉 입구 이정표
16:32 화랑교육원 정류소/산행종료
==========
16:52-17:07 화랑교육원-고속버스터미널 10번버스 이동
17:30-18:30 경주-양산 시외버스
18:45-19:15 양산-수정역 지하철 이동
20:45 수정에서 저녁 식사후 귀가
이 지도의 북쪽 남산 금오봉(468m), 남쪽의 금오산은 495m의 고위산, 우측 아래의 마석산은 353m,
우측의 금오산은 고위봉보다 위도가 조금 높으니 봉화대봉은 아닐테고, 그렇다면 칠불암 위의 신선대일 듯..







상서장[上書莊]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신라시대 문신 최치원(崔致遠)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집.
왕정골의 남쪽에 있으며 1984년 5월 21일 경상북도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었다. 최치원은 12세 때 중국 당나라에 유학하고,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하였다. 885년(헌강왕 11) 귀국하여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는데 애썼고 특히 894년(진성여왕 8)에 진성여왕에게 시무10조(時務十條)를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고려 현종 때는 최치원의 학문과 곧은 성품을 높이 평가하여 문창후(文昌侯)에 추봉하고 공자묘에 배향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최치원이 머물며 공부하던 곳을 임금에게 글을 올린 집이라는 뜻으로 상서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고려 말기에는 이곳에 문창후최치원상서장유허비(文昌侯崔致遠上書莊遺墟碑)를 세웠다.
그뒤 건물이 퇴락하여 허물어졌고 지금 건물은 근년에 후손들이 다시 세웠다. 현재 이곳에는 영정각(影幀閣), 상서장, 추모문(追慕門) 등이 세워져 있는데 영정각에는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고 향사를 지낸다. 상서장 밑 계단에는 신라 때의 건물 초석의 흔적인 주춧돌 두 개가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서장 [上書莊] (두산백과)

고운대[孤雲臺]
경주시 인왕동 산37-2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머물렀던 곳으로, 위에는 상서장(上書裝)이 있고아래에는 문천(蚊川)이 흐르며 월성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선생은 임금에게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를 올리공이곳에 올라 기다렸으나 끝내 나라의 부름을 받지 못하자 표연히 신라를 떠났다.
후세 사람들이 이곳을 '고운대'라 하고 그의 충정을 기렸다.
1724(경종 4)에 최수(崔琇)의 문집 '오연유고(烏淵遺稿)'에 '이곳은 학사 최치원이 머물렀던 곳이다. 그가 떠난 후 고운대 터는 아직 남아 있으며 높이는 5.6장(丈)이다. 아래에 문천이 흘러 간다.'(此 崔學士孤雲所遊處也 孤雲去後 臺基尙存 臺之高 可五六丈 臺之下 有水 縈廻而去//縈廻영회:빙빙 휩싸여 돌아감)라고 하였다.
<신라문화연구원 편저, 중국에서 활약한 신라인 중에서>
縈얽힐 영, 1. 얽히다 2. 감기다 3. 굽다 4. 두르다, 둘러싸다







경주 남산 신성비[慶州南山新城碑]
591년(신라 진평왕 13년) 신라 도성인 경주(慶州)의 남산(南山)에 산성(남산 신성)을 쌓을 때 축성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새겨 세운 비석.
지금까지 총 10개의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각 비문의 내용과 형식은 대체로 비슷하다. 비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신해년(辛亥年), 즉 591년 2월 26일 비석을 세우면서 만일 3년 안에 성벽이 무너지면 죄를 달게 받겠다는 맹세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축성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심어 주기 위한 문구로 모든 비석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두 번째 부분은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는 책임자의 명단이다. 이 축성 공사에는 신라의 여러 지역에서 백성들이 동원되었는데,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각 지역의 유력자들이다. 따라서 남산 신성을 쌓을 때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해당 지역의 유력자들을 통해 필요한 인원을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 지역 유력자들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또 당시 신라 지방이 군(郡)-성(城)⋅촌(村)이라는 행정 단위로 구성되었고, 성⋅촌이 지방 행정의 근간을 이루었음도 알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은 담당한 공사 구간의 길이를 적었는데, 각 비마다 작업 집단의 규모나 지형 조건이 달라 담당 구간은 조금씩 차이가 났다. 예컨대 제1비는 11보 3척 8촌이었고, 제2비는 7보 4척이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남산 신성의 규모가 2850보이므로, 최소 200개 이상의 공사 구간이 설정되었을 것이고 그 수만큼 비석이 세워졌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남산 신성비가 발견될 수 있다.
'경주 남산 신성비(慶州南山新城碑)'는 6세기 말 신라의 축성 방식은 물론, 지방 통치 제도와 인력 동원 체제에 대해서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문헌 사료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귀중한 내용으로, 6세기 신라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관련자료
ㆍ경주 남산신성비(慶州南山新城碑)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신라 중고기의 역역 동원 체제 ㆍ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
















































이야기는 지난 10월30일에 망산, 벽도산을 갔을 때 망산에서 챙긴 이야기와 같을 터...
<망산, 남산의 전설>
오랜 옛날 태고의 서라벌에는 가운데로 맑은 시내가 유유히 흘러가는 푸른 벌판이 있었을 뿐 산은 없었다.
어느날 이 벌판으로 흘러가는 시냇가에서 한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이때 두 신(神)이 서라벌로 찾아왔다.
한 신은 검붉은 얼굴에 강한 근육이 울퉁불퉁한 남신이었고,
또 한 신은 둥근 얼굴에 샛별 같이 눈동자가 반짝이는 아주 부드러운 여신이었다.
신은 평화롭고 기름진 서라벌의 경치를 둘러보면서
“야! 우리가 살 곳은 여기로구나!”
하고 감탄하여 외쳤다.
이때 빨래하던 처녀가 신들이 외치는 우레 같은 큰 소리에 놀라며 소리나는 곳을 바라 보았다.
아! 그런데 산과 같이 거대한 남녀가 자기 쪽으로 발을 옮겨 걸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겁에 질린 처녀는
“산 봐라!”
하고 힘을 다해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산과 같은 사람봐라!’ 해야 할 말을 너무 급하여 “산 봐라!” 하고 외쳤던 것이다.
발 아래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두 신은 발을 멈추었는데 다시는 발을 옮길 수 없게 되었다.
처녀의 외침에 따라 그 자리에서 두 신은 산으로 변했던 것이다.
자기들의 소원대로 서라벌을 안고 처녀의 말을 따라 산이 된 것이다.
여신은 남산 서쪽에 아담하게 솟아오른 부드럽고 포근한 망산(望山)이 되고, 남신은 검은 바위와 붉은 흙빛으로 울퉁불퉁한 산맥을 모아 장엄하게 자리한 남산(南山)이 된 것이다.
두 부부의 신이 변해 이루어졌다는 남산과 망산은 지금까지 나란히 정답게 솟아 있다.
남산은 억센 바위로 된 오랜 산인데 비해, 망산은 아직도 새각시처럼 정숙한 푸른 산이다.
그 후 서라벌 둘레에는 많은 산들이 생겨났는데, 망산 바로 곁에는 젊고 푸른 청년의 벽도산(碧桃山)과 선도산(仙挑山)이 솟아
있어 그들은 젊은 팔을 벌려 얌전하고 예쁜 망산을 쉴새없이 유혹한다.
그러나 망산의 머리는 한결같이 남산쪽으로 향하고 있다.
“망산의 절개가 변하지 않는 한 서라벌 처녀들의 순결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믿어온 서라벌의 딸 가진 부모들은 망산을 바라보면서 한시름 덜고 살아온 것이다.
여기 안내문은 같은 내용을 조금 ...
<남산(南山)과 망산(望山)의 유래>
옛날 경주의 이름은 '서라벌(徐羅伐)', 또는 '새벌'이라 했으며 새벌은 동이 터서 솟아오른 햇님이 가장 먼저 비춰주는 광명에 찬 땅이라는 뜻으로 아침 햇님이 새벌을 비추고 따스한 햇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아름답고 온갖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여 언제나 복된 웃음으로 가득 찬 평화로운 땅이었다.
이 평화로운 땅에 어느날 두 신이 찾아왔다.
한 신은 검붉은 얼굴에 강한 근육이 울퉁불퉁한 남신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갸름한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 예쁜 웃음이 아름다운 여신이었다.
두 신은 아름다운 새벌을 둘러보고
"야! 우리가 살 땅은 이곳이구나!"
하고 외쳤고, 이 소리는 너무나 우렁차 새벌의 들판을 진동하였다.
이 때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처녀가 놀라 소리나는 곳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산 같이 두 남녀가 자기쪽으로 걸어 오는 것이 아닌가.
처녀는 겁에 질려
"산 봐라!"
하고 소리 지르고는 정신을 잃었다.
'산 같이 큰 사람 봐라!'라고 해야 할 말을 급한 나머지 '산 봐라!'하고 외쳤던 것이다.
갑자기 발 아래에서 들여오는 외마디 소리에 두 신도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 움직일 수 없는 산이 되었는데 소원대로 이곳 아름답고 기름신 새벌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이다.
남신은 기암괴석이 울퉁불퉁학 강하게 생긴 남산(南山)이 되었고, 여신은 남서 서쪽에 솟아있는 부드럽고 포근한 망산(望山)이 되었다고 전해져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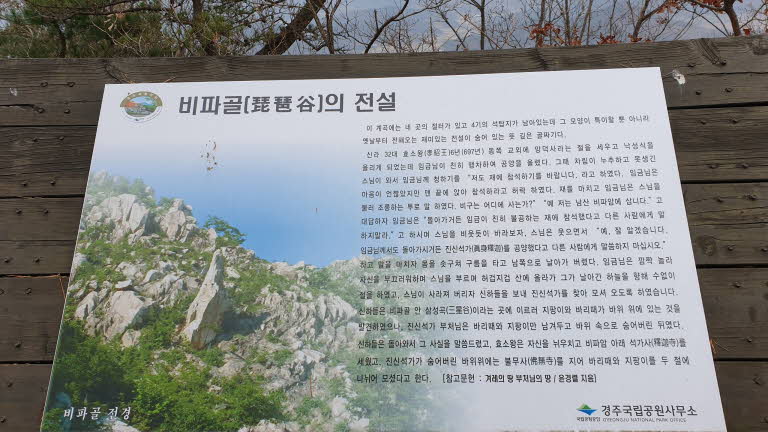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慶州 南山 茸長溪 池谷 第三寺地 三層石塔)
보물 제1935호 (지정(등록)일 : 2017.04.07)
이 석탑은 무너져 있던 것을 2000년∼2001년까지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선행한 후, 석탑 부재를 모아 2002년에 복원하였는데 노반석 아래의 부재는 남아있는 원 부재를 사용하였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어 용장계지곡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되었는지 확인할 만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탑지 주변에서 ‘용(茸)’자명을 비롯한 9점의 명문와가 출토되어 茸長寺와의 연관성이 짐작된다. 용장사지(탑상곡 제 1사지)에는 삼층석탑과 마애불좌상, 석불좌상이 전해오며, 그 일대에 여러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곡 제3사지에서 출토된 와당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을 통해서 이곳의 사찰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석탑지에서 주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등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사찰이 이어져 왔음을 말해준다.
이 탑은 전탑형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방형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이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전형적인 통일신라석탑과 다른 점을 보인다. 그 세부를 살펴보면, 7매의 석재로 이루어진 지대석 위에 8매의 기단석이 상·하 2단으로 나뉘어져 각각 4매씩 올려져 있다. 상층 기단석 위에는 3단의 탑신 받침이 있는데, 하단 모서리가 깨진 상태이며, 이 탑신받침 위에 1매의 석재로 된 1층 탑신석이 올려 있고 그 위에 올려진 옥개석 전각의 네 모서리에는 풍탁이 달려있던 구멍이 뚫려있다.
2층 탑신석 역시 1매의 돌로 이루어졌으며, 3층 탑신은 2층 옥개석 낙수받침의 상단과 3층 옥개석의 하단이 맞닿아서 이어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전탑은 안동을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이 탑과 유사한 벽돌형식 석탑은 경주지역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역적 맥락을 이룬다. 즉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65호)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124호) 등과 함께 경주지역, 특히 남산 주변에서 조형된 장소적인 특징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석탑에서 '전탑형석탑'이라는 하나의 계보를 이룬다.
이 탑은 모전탑 계열의 형식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서악동 석탑과 남산동 동 삼층석탑을 통해 제작시기의 추정이 가능하고, 일부 파손되었으나 상륜부가 남아있고,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양호한 편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가치가 있다.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慶州南山神仙庵磨崖菩薩半跏像]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마애불. 보물.
보물 제199호. 절벽의 바위 면을 얕게 파고, 고부조(高浮彫 : 모양이나 형상을 나타낸 살이 매우 두껍게 드러나게 한 부조)로 새긴 마애불이다.
머리에는 높은 삼면보관(三面寶冠)을 썼으며, 그 위로 보계(寶髻)가 솟아 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정제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두 볼이 처져 비만한 모습은 근엄한 표정과 함께 남성적인 기풍이 역연하다. 머리카락은 어깨 위에까지 늘어져 둥글게 뭉쳐 있다.
신체는 어깨가 넓고 무릎 폭이 넓어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는데, 천의(天衣)는 약간 비만한 몸의 굴곡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무릎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들어 오른손에는 꽃가지를 쥐고 왼손은 엄지와 장지를 맞대었으며, 오른발은 대좌 아래로 내려 연꽃 족좌(足座)를 밟고 왼다리를 무릎 위로 올려 유희좌(遊戱坐)에 가까운 반가좌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의 보살상은 시대가 지나면 보타락가산(普陀洛迦山)에 상주하는 관음보살로 표현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좌는 옷자락이 대좌를 덮고 있는 상현좌(裳懸座)로서, 옷주름은 고식의 기하학적인 의문(衣文)이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다. 발밑에는 동적인 화려한 구름을 새겨 상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이 보살상이 천상(天上)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광배는 바위 면을 주형(舟形)으로 얕게 파내어 거신광(擧身光)으로 삼고, 그 내부는 세 줄의 선으로 두광과 신광을 구분하였다. 광배의 윗면은 일단의 턱이 지면서 가로로 길게 팬 자국이 있어 본래는 목조 전실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체의 양감(量感)이 강조된 조각 기법과 섬세한 세부 표현, 장식성의 경향이 엿보이는 점 등에서 이 마애보살상은 전성기 통일신라 조각 양식에서 조금 벗어난 8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慶州南山神仙庵磨崖菩薩半跏像]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慶州南山七佛庵磨崖佛像群]
경상북도 경주시 칠불암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7구의 마애불. 불상군.
국보 제312호. 바위 면에 부조된 삼존불상과 그 앞의 돌기둥에 부조된 4구의 불상 등 모두 7구의 불상이 있어 칠불암으로 불려 오고 있다. 유구(遺構)의 상태로 보아 원래는 석경(石經)을 벽면으로 세운 일종의 석굴사원(石窟寺院)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삼존불상은 4.26m 높이의 바위 면에 꽉 차게 부조한 마애불로서, 거의 환조(丸彫)에 가까운 고부조(高浮彫: 모양이나 형상을 나타낸 살이 매우 두껍게 드러나게 한 부조)로 되어 있다. 본존은 높이가 2.6m나 되는 거대한 좌상이며, 두 협시보살도 2.1m로 인체보다 훨씬 장대하다.
본존은 머리가 둥글고 크며 소발(素髮)에 큼직한 육계(肉髻)가 솟아 있다.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은 풍만하여 박진감이 넘치며, 부풀고 곡선적인 처리로 자비로운 표정을 띠고 있다. 즉, 부풀고 두껍게 처리한 눈두덩이라든가 쌍꺼풀진 오른쪽 눈, 부드러우면서도 양감나게 처리한 코, 세련된 입, 어깨까지 닿은 긴 귀 등 자비롭고 원만한 얼굴 모습을 성공적으로 묘사하였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없으며, 어깨는 넓고 강건하여 건장한 가슴, 가는 허리와 더불어 당당하며 박진감 넘치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수인(手印)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으로 두 손이 유난히 큼직하다.
법의는 우견편단(右肩偏袒)인데 상체의 옷주름은 곡선적인 계단식 주름이며, 옷깃이 반전(反轉)되었다. 하체의 옷주름은 큼직한 선으로 처리되었는데, 두 다리 밑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규칙적인 지그재그 무늬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좌는 위로 향한 연꽃잎과 아래로 향한 연꽃잎의 이중연화좌로서 단판칠엽(單瓣七葉)은 잎들 사이의 잎에 중간선을 그은 특이한 형태로서, 9세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연화문의 조형(祖形)으로 주목된다. 광배는 보주형(寶珠形)의 소박한 무늬를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협시보살은 좌우 모두 동일한 모습에 비슷한 양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풍만한 얼굴, 벌어진 어깨, 당당한 가슴, 풍만하고 육감적인 체구, 유연한 삼곡(三曲)의 자세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왼쪽 보살은 꽃을 들고 있고 오른쪽 보살은 정병(淨甁)을 들고 있으며, 모두 본존 쪽을 향하여 몸을 약간 비틀고 있다.
이 삼존불 앞의 돌기둥에 새겨진 사방불은 높이가 2.23m 내지 2.42m 정도로 바위 모양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고 있는데, 네 상 모두 연화좌에 보주형 두광을 갖추고 결가부좌하였다. 동면상(東面像)은 본존불과 동일한 양식으로 통견(通肩)의 법의가 다소 둔중하나 신체의 윤곽이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왼손에는 약합(藥盒)을 들고 있어서 약사여래로 생각된다. 남면상(南面像)은 여러 면에서 동면상과 비슷하나, 가슴에 표현된 군의(裙衣)의 띠 매듭은 새로운 형식에 속하며, 무릎 위의 옷주름, 짧은 상현좌(裳懸座)의 옷주름이 상당히 도식화되었다.
서면상(西面像)은 동면상과, 북면상(北面像)은 남면상과 서로 유사하나, 북면상은 다른 세 불상과 달리 특히 얼굴이 작고 갸름하여 수척한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네 상의 명칭을 확실히 하기는 어려우나, 방위(方位)와 수인(手印)·인계(印契)에 의하여 볼 때 일단 동면상은 약사여래, 서면상은 아미타여래로 볼 수 있다.
이 불상군의 성격은 사방석주 각 면에 한 불상씩 사방불을 새기고, 그 앞의 바위에는 삼존불을 새겨 삼존불이 중앙 본존불적인 성격을 띤 오방불(五方佛)로서의 배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식적으로는 풍만한 얼굴 모습, 양감이 풍부한 사실적인 신체 표현, 협시보살들의 유연한 삼곡자세 등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여래좌상(보물 제666호)이나 경주 석굴암 석굴의 본존불좌상(국보 제24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 제121호) 등의 불상 양식과 상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불상군의 조성 연대는 통일신라시대 최성기인 8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慶州南山七佛庵磨崖佛像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칠불암에서 하산하는 길은 한참 동안이나 돌계단을 밟고 가야 하며 돌계단이 끝나도 돌길이 이어진다.
이 길로 하산하는 팀이 많지 않아 보인다. 나도 2013년3월31일에 탐방했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갔었다.
오늘은 본래 동남산길을 걷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남산으로 올랐다.



경주 승소곡 삼층석탑(慶州 僧燒谷 三層石塔)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에 전시된 석탑으로 높이는 3.56m이며, 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ㅗㄹ 추정.
1층 몸돌에서 안상(眼象:원형이나 장방형의 곡선을 새겨서 우묵하게 파낸 조각의 일종)을 새기고 안에 사천왕상을 네 면에 1구씩 새겼다.
2층 기단 각 면에는 안상을 2기씩 표현했다.
일제강점기(1930년대) 삼층석탑이 무너진 채 있던 것을 조사하고, 탑재들을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으로 옮겼다.









경주 서출지 [慶州 書出池]
남산동 삼층쌍탑에서 통일전 쪽으로 나오면 왼쪽으로 연꽃이 잠긴 긴 못과 옛집이 눈에 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ㄱ자형인 옛집은 이요당(二樂堂)이라는 정자로 연못과 호 안에 걸쳐 들어서 있다. 이요당 앞에 있는 이 연못은 21대 소지왕이 이 못에서 나온 노인이 바친 서책에서 궁녀와 중이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아내고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전설이 담긴 서출지이다.
이 전설에서 주목되는 점은 ‘분향(焚香) 수도(修道)하던 스님’에 대한 기록이다. 소지왕은 417년부터 499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신라 21대 왕이다.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것이 23대 법흥왕 때이니 불교 공인 이전에 불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알게 해준다.
못에 연꽃이 만발할 때도 볼 만하거니와 못가에 우거진 수백 년 된 배롱나무가 꽃을 피워 소나무와 어우러질 때면 못가의 이요당과 썩 잘 어울린다. 이요당은 1664년 임적이 세웠다. 사적 제138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출지 (답사여행의 길잡이 2 - 경주, 초판 1994., 개정판 23쇄 2012., 한국문화유산답사회, 김효형, 박종분, 김성철, 유홍준)




[동남산 가는 길 명소]
◈ 월정교/사적 제457호
월정교는 '삼국사기'에 '경덕왕 19년 2월 궁의 남쪽 문천상에 춘양, 월정 두 다리를 놓았다.'라는 기록에서 전하는 교량으로 신라 왕경의 주요 교통로였다.
◈ 춘양교지/사적 제457호
월정교와 함께 신라 왕경의 주요 교통로, 춘양교가 있었던 터.
◈ 인용사지/도문화재자료 제240호
문무왕 때 김인문(金인問,629-694)을 위하여 세워졌던 仁容寺터
◈ 상서장/도기념물 제46호
신라 명필 최치원이 머무르며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곳
◈ 남산불곡 마애여래좌상/보물 제198호
부처의 얼굴이 온화한 할머니를 닮았다 하여 할매부처, 혹은 감실부처로 불리며 남산의 불상중 연대가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
◈ 남산탑곡마애불상군/보물 제201호
통일신라시대 신인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으로 높이 9m나 되는 커다란 바위에 황룡사 9층목탑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있으며, 여러 불상들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 남산미륵곡석조여래좌상/보물 제136호
신라시대 보리사터로 추정되는 곳에 남아 있는 불상으로 경주 남산에 있는 신라시대석불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 보리사 마애석불/도유형문화재 제193호
통일신라시대의 마애불로서는 드물게 온화한 얼굴표정과 단정한 자세에 의해 명상에 잠긴 부처의 자비심을 표현한 마애불이다.
◈ 헌강왕릉/사적 제187호
신라 제49대 헌강왕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유명한 경문왕의 첫째 아들이다.
재위중 처용무가 크게 유행하였으며 경주의 민가는 모두 기와로 덮고 숯으로 밥을 짓는 등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때부터 신라는 점점 쇠퇴기에 접어 들었다.
◈ 정강왕릉/사적 제186호
신라 제50대 왕이 정강왕은 경문왕의 둘째 아들로 형인 헌강왕에 이어 즉위하였다.
재위기간이 짧아 별다른 치적은 보이지 않으며 자식이 없어 누이동생 '만'이 신라 51대 진성여왕이 되었다.
◈ 서출지/사적 제138호
이 못에서 글이 나와 신라 소지왕을 죽이려는 계략을 막았다 하여 이름을 서출지(書出池)라 부르고,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백일홍과 어우르진연꽃이 빼어나게 아름답다.
◈ 남산동 동서삼층석탑/보물 제124호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쌍탑은 대체로 동일하 양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비해 이 동서 두 탑은 각각 양식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흔치 않은 모습이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마주서 있다.
◈ 염불사지 삼층석탑/사적 제311호
삼국유사에 나오는 염불사에 있는 석탑으로 스님의 염불 소리가 한결같이 낭랑한 목소리로 들였다고 해서 염불사로 불린다.
◈ 경북산림환경연구원
◈ 화랑교육원
◈ 통일전

경주 정강왕릉[慶州定康王陵]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제50대 정강왕의 능. 왕릉. 사적
사적 제186호. 지정면적 3만 5,702㎡, 무덤의 지름은 15.7m, 높이는 4m이다. 정강왕의 성은 김씨, 이름은 황(晃)이다.
경문왕의 둘째아들로, 886년 7월에 왕이 되어 887년 7월에 승하하였으므로 만 1년간 왕으로 있었다. 승하한 뒤 보리사(菩提寺) 동남쪽에 장사하였다는 기록에 따라 이곳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강왕릉을 제47대 헌안왕릉으로 보는 설도 있다.
무덤의 외부모습은 둥글게 쌓아올린 봉토(封土) 밑부분을 3단으로 쌓아 무덤의 보호석으로 하였는데 모두 가공한 장대석(長臺石)으로 축조하였다. 하단의 지대석(地臺石)은 보다 넓게 하였고 그 위에 2단의 석축을 쌓았는데 최상면에 올려놓는 갑석(甲石)은 원래 없었다. 내부는 발굴되지 않아 확실치 않으나 시기적으로 보아 형의 무덤인 제49대 헌강왕릉과 같은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으로 추정된다. 왕릉 앞에는 1매의 판석으로 된 상석이 있고, 그 앞에 다듬은 장방형 화강석으로 축조한 석단이 있다.
재위기간이 짧아 치적이 없으면서도 무덤의 외형이 선왕인 헌강왕릉과 같은 것은 형인 선왕의 무덤구역에 함께 축조하게 된 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주 정강왕릉 [慶州定康王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주 헌강왕릉[慶州憲康王陵]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제49대 헌강왕의 능. 왕릉. 사적.
헌강왕의 성은 김씨, 이름은 정(晸)이며, 경문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문의왕후(文懿王后), 비는 의명부인(懿明夫人)이다. 875년에 즉위하여 886년에 승하할 때까지 12년간 재위하면서 문치와 내정에 힘썼다.
헌강왕릉은 1969년 8월 27일에 사적 제187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6만 9,626㎡이다. 왕릉의 배경인 남산은 주능선이 남북으로 길게 기복하고 그곳에서 달려나간 각 소릉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많은 골짜기와 봉우리에 형성되어 있다. 이 왕릉은 남산의 주능선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한 지릉의 말단에 위치한다.
헌강왕릉에 대한 보수 수습 조사는 1993년 8월 초 우기 때의 자연붕괴로 인해 그 해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45일간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봉토 단면과 유구 내부를 조사할 수 있었다. 무덤 크기는 지름 15.3m, 높이 4.2m이다. 무덤의 외부모습은 흙으로 덮은 원형봉토분으로서 밑둘레에는 길이 60∼120㎝, 너비 30㎝ 내외의 다듬은 돌을 이용하여 4단으로 쌓아올려 무덤의 보호석으로 삼아 튼튼히 하였다.
무덤 양식은 널길을 동벽에 편향해서 설치한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이다. 널방은 남북길이가 2.9m인데, 남북길이가 동서길이보다 약간 더 긴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널방의 벽석들은 최하단의 생토층을 약간 파내고 직경 40∼60㎝ 전후의 괴석으로 축조하였다. 하단부에는 비교적 큰 석재를, 상단부에는 작은 석재를 쌓았으며 사이사이 공간은 잡석으로 채운 후 틈사이를 강회로 막고 있다. 널방의 벽면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안으로 기울었으며 구석부분은 엇물려쌓기 방식으로 석재를 처리하고 있다.
널길은 널방 남쪽의 동쪽면에 치우쳐 부설되어 있으며 제반시설인 돌문〔石扉〕, 문지방, 폐쇄석, 무덤길〔墓道〕등을 갖추고 있다. 돌문은 장방형 괴석 한쌍을 동서에 수직으로 세워 활용했다. 문지방은 장방형 깬돌 3매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남북 장축의 평평한 면이 위로 오도록 가지런하게 놓고 빈 공간에는 잡석을 채워서 돌문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무덤길은 널길 뚜껑돌 아래의 첫 번째 남쪽 벽석부터 널길쪽으로 약간 튀어나오도록 하여 무덤길과 널길을 구분지었으며 이들 바닥층은 직경 15㎝ 내외의 납작한 자연석 1단을 전면에 깔았다.
경주지역의 고분들은 대략 널무덤〔木棺墓〕·덧널무덤〔木槨墓〕시기,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시기, 굴식돌방무덤 시기의 3시기로 구분된다. 그런데 3시기의 묘제, 곧 굴식돌방무덤은 구조상 붕괴될 위험이 크고 도굴이 용이하다. 따라서 이 양식의 신라왕릉에 대한 연구경향은 봉분과 둘레돌 등의 외형적 모습을 서로 비교한 후 문헌과 접목시켜 왕릉 주인공의 진위여부나 위치와 선후관계를 밝히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헌강왕이 승하한 뒤 보리사(菩提寺)의 동남쪽에 장사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리사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무덤을 헌강왕릉으로 비정하는 것이다. 보리사는 헌강왕릉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비구니 사찰로서 최근에 중건되었다. 그런데 이 사찰 뒤편에서 보물 제136호인 석불좌상이 발견된 바 있는데, 이 불상의 제작연대를 대략 8세기 중엽에서 후엽의 작품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헌강왕이나 정강왕이 승하한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이 석불좌상 외에도 주변에 산재하는 각종 석재, 탑재들과 지형은 과거 이곳에 존재하던 보리사와 관련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편 헌강왕릉은 무덤 보호석을 다듬은 돌을 사용하여 4단으로만 쌓아 올린 형식을 보이는데,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왕릉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써 중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주헌강왕릉 [慶州憲康王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